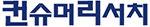최근 이와 관련된 피해가 잇다르고 있지만 통신사들은 “소비자와 판매자 간 사적인 계약”이라며 뒷짐을 지는 상황이어서 소비자들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. 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할부원금을 꼼꼼히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.
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김 모(여)씨는 16일 “세상 물정 잘 모르는 나이 드신 분에게 ‘공짜폰’이라고 속여 가입시킨 뒤 이제 와서 발뺌만 하고 있다”며 어이없어했다.
김 씨의 아버지(남.72세)는 지난 4월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2년 약정에 54요금제로 갤럭시S3 스마트폰을 개통했다.
잠깐 집에 들러 우연히 계약 서류를 보게 된 김 씨는 비싼 요금제에 기기할부금까지 매달 7~8만원을 내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기가 막혔다. 아버지 연세가 많아 스마트폰이 뭔지도 잘 모르는 데다 사는 곳이 산골이라 LTE, 와이파이도 잘 터지지 않아 사실상 무용지물이였다.
다행히 아직 가입 후 14일이 지나지 않아 아버지를 대리점으로 보냈지만 직원은 “2년 약정이라 취소할 수 없고 저렴한 요금제의 공짜폰으로 바꿔주겠다”고 꼬였다.
하지만 공짜폰 이라던 휴대전화 역시 24개월 약정에 34요금제로 기기값 1만1천60원, 가입비 7천920원, 요금할인 1만2천100원으로 설정돼 있었다. 매달 내는 요금은 4만4천280원.
뒤늦게 이 사실을 안 김 씨가 항의하자 판매점 측은 “요금 할인을 받아서 요금만큼 나오게 만들어줬다”며 “요금제만큼만 나오게 만드는 게 공짜”라고 응수했다. 점장은 한술 더 떠 “공짜폰이라고 해서 판매한 적이 없다”며 증거가 있느냐는 식으로 되레 큰소리쳤다고.
김 씨는 “최근 서랍 속에 넣어둔 휴대전화를 보고서야 아버지가 공짜폰을 받아온 걸 알았다”며 “4개월 동안 쓰지도 못하고 자식들 알까 봐 말도 못하고 마음고생 했을 아버지를 생각하니 분통이 터진다”고 목소리를 높였다.
이에 대해 통신사 관계자는 “일선 판매점에서 공짜라고 했다가 기기값을 청구하는 ‘공짜폰’ 마케팅을 하는 경우가 있다”며 “소비자들은 휴대전화를 살 때 단말기 할부원금을 꼭 확인해야 한다”고 말했다.
저작권자 © 컨슈머리서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